특이질병 케이스스터디: 웃거나 울면 한쪽 얼굴이 떨리는 병, '반쪽 얼굴 경련(Hemifacial Spasm)'
한쪽 얼굴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병
반쪽 얼굴 경련(Hemifacial Spasm, HFS)은 얼굴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반복 수축하는 신경 질환으로, 보통 얼굴의 한쪽만 영향을 받는다. 증상은 대개 눈 주위 근육에서 시작해 점차 뺨, 입 주변, 심하면 목 근육까지 확장된다. 환자들은 마치 한쪽 얼굴이 ‘경련하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 이 경련은 웃거나 울 때,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또는 피로·스트레스·긴장 상황에서 악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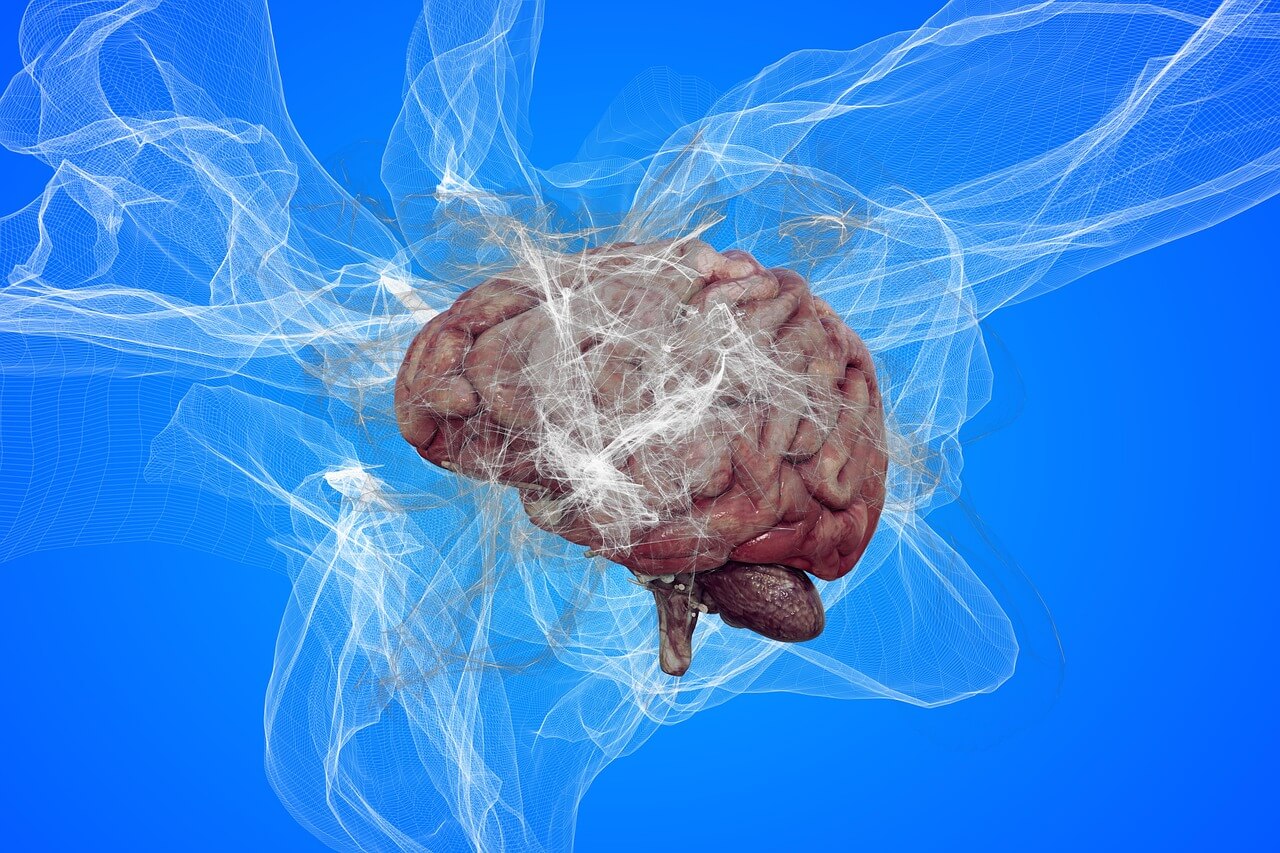
질환 초기에는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안검연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피로나 안과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림이 강해지고 지속시간이 늘어나며, 눈이 완전히 감겨 시야가 차단되거나,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 불편이 나타난다. 심리적 부담도 크다. 대인 관계에서 표정이 의도치 않게 변형되면 오해를 사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고, 환자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져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된다.
원인과 발병 기전
반쪽 얼굴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안면신경(Facial Nerve, 제7뇌신경)의 혈관 압박이다.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주행하는 경로에 작은 동맥(주로 후하소뇌동맥 또는 전하소뇌동맥)이 접촉하거나 압박을 가하면,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흥분한다. 이때 신경 전도 과정이 왜곡되어 근육이 자율적으로 수축하는 경련이 발생한다.
드물게는 뇌종양, 뇌혈관 기형, 다발성 경화증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이차성 HFS라고 하며, 신속한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 선천적 혈관 구조 이상, 외상 후 신경 손상, 염증도 위험 인자로 보고된다. 병리학적으로는 신경 말초부위의 탈수초화(demyelination)가 중요한데, 신경을 감싸는 절연물질인 수초(myelin)가 손상되면 비정상 전기 신호가 인접 신경섬유로 전도되어 동시 발화(cross-talk)가 일어나, 근육이 원치 않게 움직인다.
증상과 진단 과정
반쪽 얼굴 경련은 초기에는 불규칙하고 간헐적이지만, 진행되면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세진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눈 주위의 반복적 경련이며, 심하면 눈이 완전히 감겨 시야가 차단된다. 이후 뺨, 입술, 턱, 목 순으로 경련 범위가 확장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귀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경련이 수면 중에도 지속된다. 경련이 반복되면 안면 근육이 비대해져 얼굴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다.
진단은 환자의 병력과 증상 관찰이 기본이다. 경련이 얼굴 한쪽에 국한되는 점,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휴식 중·수면 중에도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한 단서다. 확진을 위해 뇌 MRI로 뇌간과 안면신경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혈관 압박 여부를 평가한다. 필요 시 MRA(자기공명혈관조영술)로 혈관-신경 접촉 부위를 더 정밀하게 본다. 종양, 뇌혈관 기형, 염증성 질환 등 이차성 원인 감별이 필수다. 전기생리검사(EMG)는 근육과 신경의 전기적 활동 패턴을 분석해, 경련이 안면신경 기원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치료와 장기 관리
치료는 증상 조절과 원인 제거를 목표로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보툴리눔 톡신 주사(Botox)로, 경련 부위 근육에 소량 주사해 신경-근육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효과는 34개월 지속되며, 반복 시술로 장기 관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영구적 치료가 아니고, 드물게 주사 부위 약화나 표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 치료로는 미세혈관 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이 있다. 이는 뇌수술을 통해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분리하고, 신경과 혈관 사이에 테플론 패드를 삽입해 재압박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성공률이 80~90%에 달하며, 장기적으로 증상 소실 효과가 높다. 그러나 뇌수술 특성상 청력 손실, 안면마비, 뇌척수액 누출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환자의 전신 상태와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다. 약물치료로는 항경련제(예: 카바마제핀, 가바펜틴)나 근이완제가 보조적으로 사용되지만, 단독 효과는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MRI-가이드 하에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신경-혈관 접촉 부위를 조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환자는 치료 후에도 스트레스·피로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증상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해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신 치료 기술과 환자 지원
최근에는 MRI-가이드 하 집속 초음파(HIFU), 정위 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등 비침습적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두개골을 열지 않고, 병변 부위에 집중된 에너지나 방사선을 조사해 안면신경 압박을 줄이는 원리다. 장점은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 위험이 낮다는 것이지만, 장기 효과와 재발률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관리도 시도되고 있다. 경련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센서, 표정 근육 움직임을 분석하는 모바일 앱은 환자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치료 시점과 효과 평가에 도움을 준다. 심리적 부담이 큰 질환 특성상, 심리 상담과 환자 커뮤니티 참여도 권장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